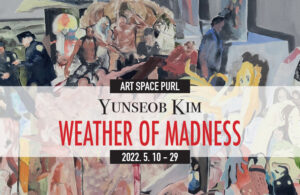2010.3.17wed ~ 3.31wed
김윤섭 안유진 옹은미 이미영

신진작가육성프로젝트는 미술이 소통되는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지향하면서 진취적인 프로젝트로 미래지향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도에서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창작의 결과만이 아니라, 창작의 과정을 통해 젊은 정신이 뿜어내는 열정과 동시대의 시각상이 어떤 실험성과 도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구체화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배작가들과 큐레이터 그리고 평론가가 멘토가 되어 여러 가지 시각차를 통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작품의 의미와 깊이를 발견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술을 통한 소통의 확장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다.
현대미술연구소/아트스페이스펄은 신진작가육성프로젝트로 영 아티스트(Young artist)를 섭외해서 개별 워크숍과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4명의 작가(김윤섭/안유진/옹은미/이미영)가 선발되었다. 이번 아트스페이스펄의 영프로(Young pro – 0%)는 이전의 NAIP(New Artist Incubation project)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젝트로 여전히 동시대 미술의 소통방식에 대한 고민을 작가와 작가/작가와 큐레이터/작가와 평론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미술창작의 구조적 변화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구조적 변화란, 창작의 고독 혹은 소외 속에서 자기 독백에 빠지기 쉬운 미술소통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위한 것이다. 또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의 첫 기획인 영프로 1기는 ‘자아를 보는 몇 가지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섭외된 작가들과 전시를 진행했다. 섭외과정에서 이루어진 워크숍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작품의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유사한 고민을 하는 작가들로 구성해 공개 프리젠테이션과 워크숍시간을 가지고 이번 전시뿐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김윤섭(Kim, Yunseob) 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개인적 경험이 어떻게 미술이라는 언어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담백한 방식을 통해 보여준다. 첫 사랑에 대한 실연을 잊기 위해 마음속 깊이 덮어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기록하고, 그 기록의 차이와 변화를 통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풀어간다. 이를테면, 동일한 인물에 대한 그리움이 매일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그려진 대상(첫사랑을 떠올리며 그리던 얼굴)의 차이와 변화를 통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안고 녹여 내듯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의 과정을 가진다. 이 같은 일련의 치유과정처럼, 김윤섭의 작업은 드로잉이나 동영상 그리고 페인팅 등 대부분의 작업이 자신의 경험과 타자와의 감성적 요소를 통해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거나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적 에너지가 된다.
안유진(An, Yoojin)은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하면서 꾸준히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을 한다. 소통과 참여를 위해 설정하는 작업방식은 주로 설치와 영상이다. 안유진이 그간에 작업해 왔던 ‘나와 너’, ‘말하기 듣기’, ‘어떤 대화’. ‘저쪽에서 만나요’ 등에서처럼, ‘나’라는 자아를 통해 ‘너’라는 타자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적 모색을 하고 있다. 하나의 장소에서 여럿인 자신을 보듯 여러 명이 복제되어 시간과 공간을 동일하게 가진 자아에 대한 안유진의 작업은 기법적으로는 입체주의 회화가 이룬 다시점의 성과를 그 자신의 영상언어인 ‘자기진단’이라는 작업을 통해 완성해낸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소통되는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열어 놓고자 하는 안유진의 이번 작업 역시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갖는 소통의 방식이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영상으로 그려낸다.
옹은미(Ong, Eunmi)는 자신이 표현하는 그림보다 그림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서투른 편이다. 어쩌면 많은 작가들이 시각이미지를 통해 이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더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옹은미의 그림에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의자나 벽면에 세워진 캔버스 그리고 붓과 물통 등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업실의 풍경을 그린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아틀리에에는 작가의 부재를 통해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함께하는 작업실의 도구들이 작가를 대신해서 그 존재감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쩌면 말수가 적은 작가가 바라보는 공간과 사물들에 깊은 존재감이 담겨있는 이유는 자신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추상적인 배경에 놓인 하나의 의자 그리고 그 의자위에 앉아 있는 청개구리나 앵무새 역시도 자신이 바라보는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를 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된다.
이미영(Lee, Miyoung)은 전통이라는 아이콘, 이를테면, 한국의 전통의상이나 전통의 회화 속에 현대인인 자신을 투영시킨다. 이미영의 작업은 전통을 해석하거나 전통과 현대라는 시간적인 차이를 자기 자신을 개입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법에 있어서도 비단에 채색을 하는 전통적인 채색화와 현대적인 설치방식이 결합되고 있다. 오랜 역사의 층, 즉 심연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미영의 작업은 1차적인 화면(사실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에 2차적인 화면(단순화되고 추상화된 구성)이 서로 겹쳐지면서 완성된 다. 그리고 두 개의 겹쳐진 그림 사이에는 조명을 설치해 과거와 현재의 시간, 전통과 현대라는 문화가 교차하거나 단절된 시간을 빛(조명장치)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은 기법과 내용 모두에 있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접점에 자아에 대한 통찰, 다시 말하면 자신에 투영된 전통과 현대 모두를 발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너라는 타자가 있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내가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해 진다. ‘자아를 보는 몇 가지의 방법’전은 타자화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젊은 작가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통해 확장된 시각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부언하자면, 불을 불로 끄지 못하고, 물이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영역에서 벗어나 주변 영역으로 확장해 갈 때, ‘나’는 ‘너’를 볼 수 있고, ‘너’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영프로전인 ‘자아를 보는 몇 가지의 방법’은 너와 내가 서로 침투하고 상호작용하는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한다. (현대미술연구소/아트스페이스펄 디렉터 김옥렬)